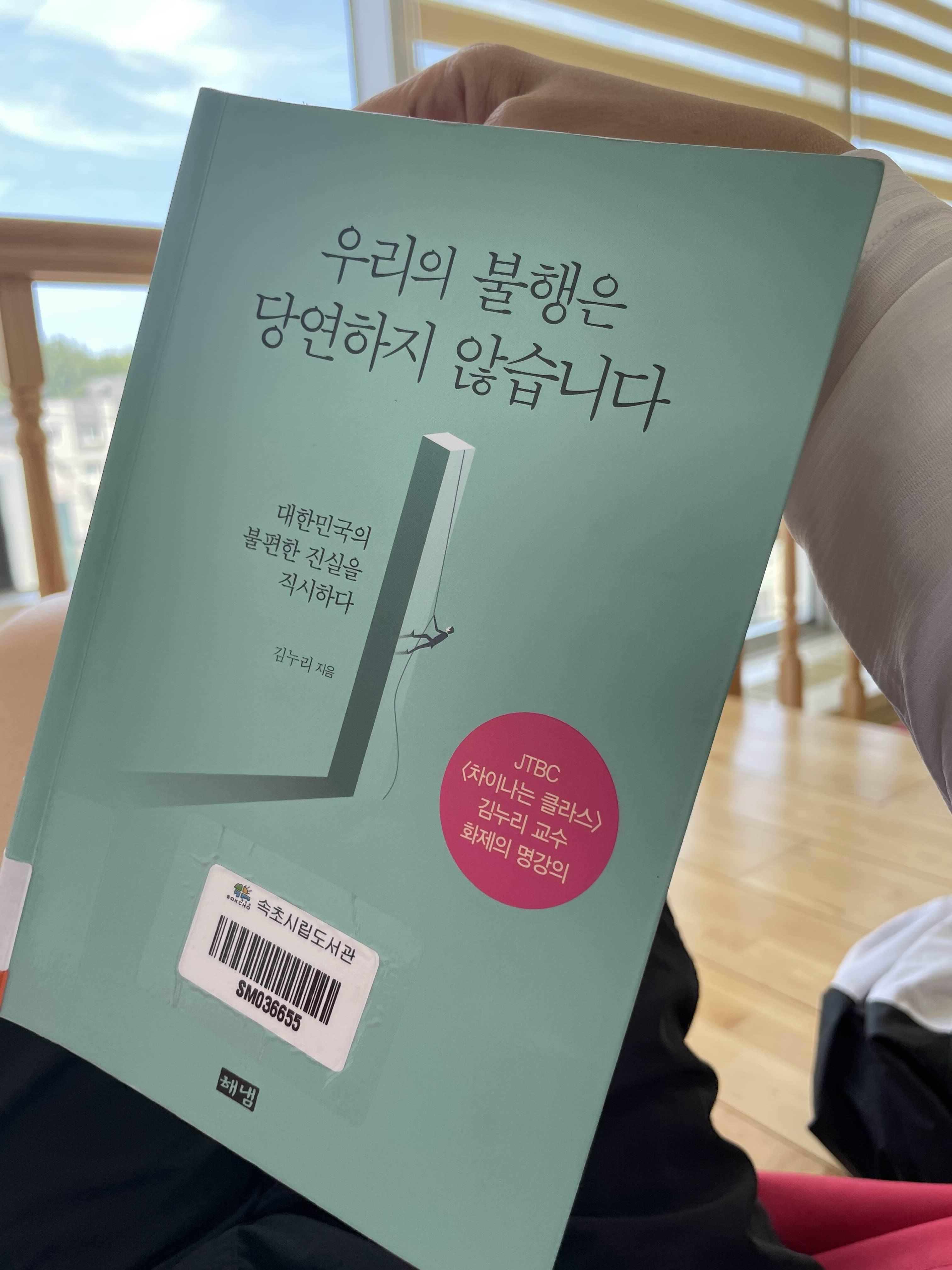
이 책의 저자인 김누리 교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 강연으로 많은이들에게 시사점을 안겼다. 동시에 ‘2020년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책’ 등에 선정된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를 통해 한국형 불행의 근원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친구의 소개로 읽게 되었는데 생각해볼 많은 주제를 안겨주었다.
무엇보다 정치적 민주화는 이루었지만 사회민주화, 문화민주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사회에서 진정한 민주시민의 삶에 대해 반추해보았다. 경제의 발전이 시민으로서의 성숙과 다른 속도로 이루어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가장 잘 알려주는 거울이 우리나의 현실인 것 같다.
다시 읽어보고 싶은 내용을 아래 기록해둔다.
--------------------------------------------------------------------------------------
이탈리아 철학자 프랑코 베라르디는 <죽음의 스펙터클>에서 한국 사회의 특징을 네 가지로 짚었습니다. 끝없는 경쟁, 극단적 개인주의, 일상의 사막화, 생활리듬의 초가속화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책은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을 독일이라는 거울에 비추어보는 방식으로 답을 구해보고자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지 정치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문제이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약자와 공감하고 연대하며, 불의에 분노하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태도. 이러한 심성을 내면화한 민주주의자를 길러내지 못하는 한 제도로써의 민주주의는 언제라도 독재의 야만으로 추락할 수 있다.
저는 한국 정치인 중 사회적 정의를 외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경쟁력'을 말합니다.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 교육 경쟁력 등 온통 경쟁력을 외칩니다.
독일의 교육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테오도르 아도르노는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은 약한 자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옳다면 민주주의에는 구성원 하나하나가 강한 자아를 가진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말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왜 취약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은 자아를 강하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약하게 만드는 교육이었습니다. 늘 학생을 야단치고 벌주고, 결국 깊은 열등감을 갖게 하는 방식이었지요.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한 민주주의로 한단계 더 나아가려면 학교에서 강한 자아를 가진 아이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어느 햇살 좋은 날, 맛있는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 좋은 추억을 떠올리며 행복감을 느낀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로 그 순간 내 안에서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네가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은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을텐데 이렇게 살면 뒤쳐지는거 알지?' 라는 불안감을 느낀적 없나요? 그것이 바로 자기 착취입니다. 한국은 개인을 억압하는 잘못된 사회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씩 언급한 인권감수성, 소비주의, 권위주의, 자기착취와 소외, 성도덕 문제에 이르기까지 68혁명의 부재가 한국사회에 드리운 그느들을 짚어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서구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깊이있게 논의되고 실천적으로 극복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념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사회는 왜 이런 지체된, 세계사의 흐름에서 유리된 사회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거쳐온 독특한 역사적 경로 때문입니다. 식민지배, 군정, 분단과 냉전, 반공주의, 군사독재와 민주화라는 격변의 역사 속에서 생겨난 아주 독특한 역사적 경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
'남기고 싶은 뭉클함. >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의 아름답고 추한 몸에게 (2) | 2022.06.16 |
|---|---|
| 크게 그린 사람 (2) | 2022.06.13 |
|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2) | 2022.03.30 |
| 동경의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0) | 2021.12.31 |
| 오래된 미래 (0) | 2021.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