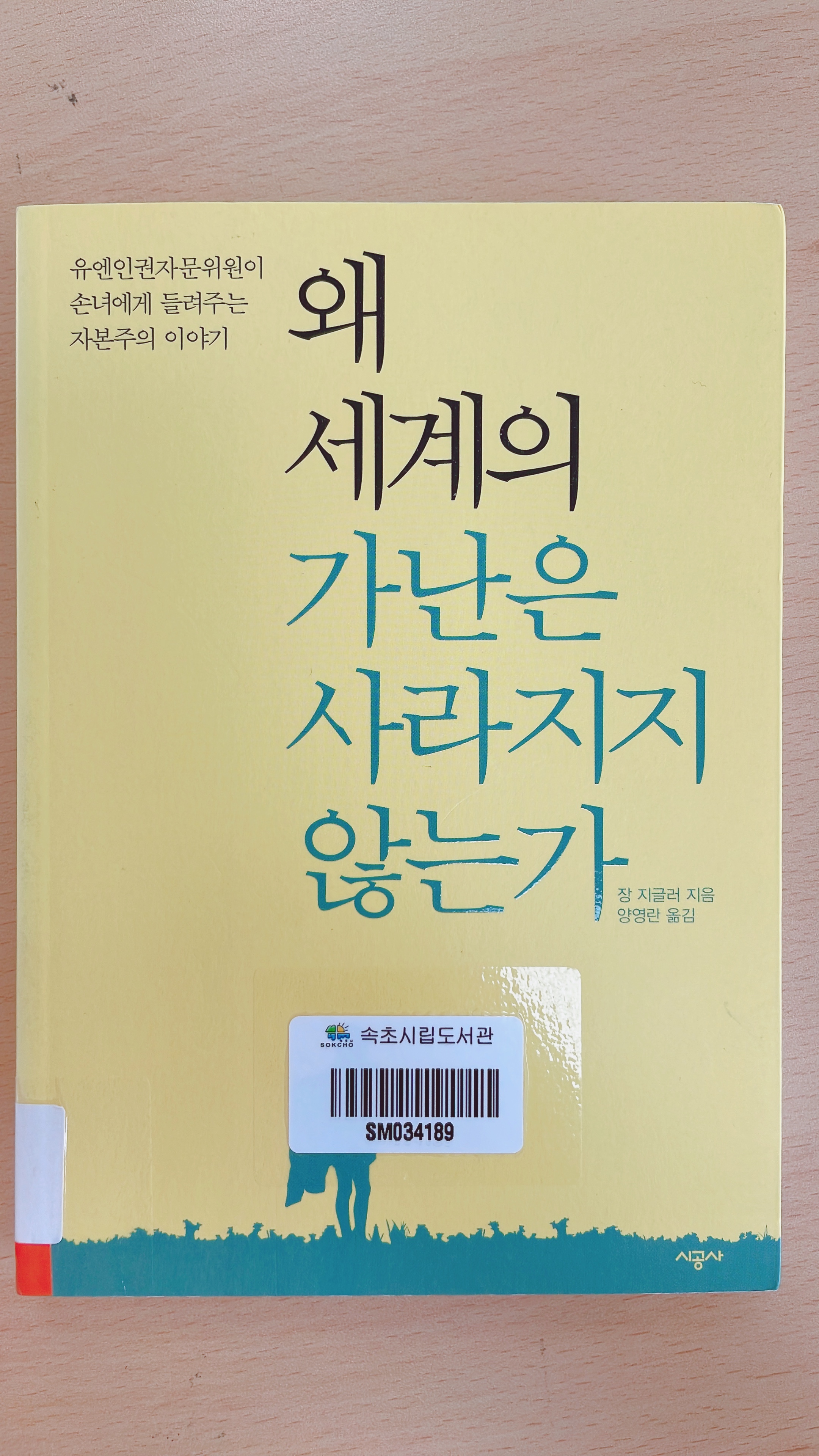
지난 5월 코로나로 인해 몇년만에 대규모로 열린 국제도서전에 다녀왔다. 주제전시 [반걸음] 큐레이션에서 이 책을 본 남자친구가 흥미로울 것 같다며 들춰봤던 책을 도서관에서 발견하고 바로 빌려왔다.
이 책은 성장하면서 서서히 사회 구조에 대해서, 자본과 금융에 대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모두 같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아이를 둔 모든 어른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장지글러의 손녀 조라처럼 아이들은 어른들과는 달리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답변을 그냥 넘기지 않는다. 스위스 사회당 의원인 장지글러의 답변은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이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것 같이 느껴질수도 있으나 사례를 들어 촘촘하게 일어난 일들을 한번 더 읽고 있자면 유엔기아문제 전문가로써의 정확한 해석 그이상도 이하도 아닌, 현상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이런 책을 읽으면 마음에 불길이 치솟듯 뜨거워지고 불공평한 사회에 일침을 가해야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비슷한 지향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의미있다고 여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 지금은 마음의 지향은 같으나 나의 놓일자리가 어디였으면 한다는 위치가 바뀐 것 같다.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자본주의 체제에서 끊임없이 가장자리로 밀려난 사람들과 함께이고 싶다. 아이들을 만난다면 환경에 굴하지 않고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삶의 마무리를 앞둔 어르신들을 만난다면 당신의 삶에 분명히 피어났을 꽃 한 송이 같이 찾아봐주는 사람이 되고싶다. 밑줄 긋고 싶었던 문장 몇개를 남긴다.
-------------------------------------------------------------------------
자본주의는 지구상에 일종의 식인 풍습을 만들어냈단다. 극히 적은 소수를 위한 풍요와 대다수를 위한 살인적인 궁핍이 식인이 아니면 뭐겠니. 시인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헀어. "부자들의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지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이야
19세기말 자본자의가 세력을 키워가는 시기에 몇몇 나라에서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정의에 부응하는 보호장치와 지원제도는 점차 발달하게 되었고, 복지국가라는 개념을 토대로 사회보장제도와 누진세율에 기반을 둔 강력한 부의 재분배 체제가 확립되었단다. 그런데 그 모든 진전이 오늘날엔 다시 멈추고 있지. 재정이 바닥인 몇몇 나라들은 야금야금 병원, 대중교통, 학교, 항구, 공항, 교도소 등의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기도 해.
인간은 분명 점차 발전된 방향으로 걸어왔단다. 노예제도 폐지란 수세기 동안 순전히 유토피아에 불과했어. 서구에서의 여성 해방이나 사회보장제도도 유토피아로 치부됐던 때가 있었지. 쿠바의 혁명가 체게바라는 이런 글을 남겼어. "가장 탄탄한 벽도 자그마한 균열로 무너진다."
난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들 중에서, 세계화된 금융 자본을 장악한 소수 지배자들이 행사하는 권력은 오늘날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정부가 되어버렸으며 그 세계 정부는 절대 다수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네가 확실하게 기억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그같은 장애에 맞서서 봉기할 의무가 있어.
'남기고 싶은 뭉클함. >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1) | 2023.03.04 |
|---|---|
| 숲속의 자본주의자 (2) | 2022.07.26 |
| 곁에 있다는 것 (3) | 2022.06.29 |
| 나의 아름답고 추한 몸에게 (2) | 2022.06.16 |
| 크게 그린 사람 (2) | 2022.06.13 |